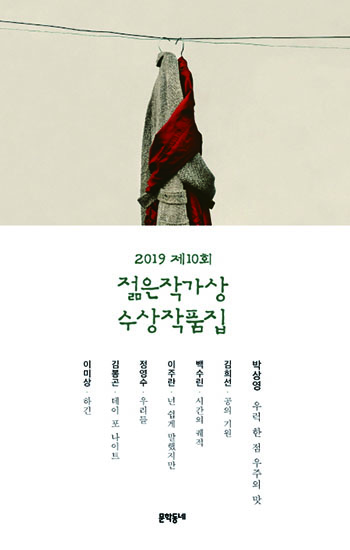
아등바등 견디고 있다는 기분,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그저 애드벌룬 허공에 붕 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어느 도시인이라면 한 번쯤 느껴보지 않았을까? 이 소설은 지쳐버린 도시인에게 건네는 마치 조그마한 위로법처럼 느껴진다. 하루에 흙을 몇 번 밟고 사는지 생각해보자. 지나가는 새의 지저귐과 꽃의 시듦.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정적이 흐를까? 삶의 순간순간을 포착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를 찾아서 주인공은 온전한 자신을 찾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있는 도시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누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인공이 친한 후배에게 들었던 말이다. 이 한마디가 직접적으로 주인공을 고향으로 돌려세우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람에게 다시는 상처를 치유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이해를 바란다는 것.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 서로를 배려한다는 의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정작 도시의 삶은 이것조차 쉽게 건네지 않는다. 어쩌면 그 전에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거나 해주기 싫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내가 바라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내게 바라고 있다는 모순. 사람들이 무감해 보이고 그저 가식적인 껍데기로 보이지만, 정작 본인 또한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껍데기라는 사실. 그 어긋남이 주인공 자신을 혐오감에 빠트렸다.
“남의 욕이라든가 나 자신이 싫다는 말들”
주인공의 일기장에 채워져 있는 말들이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바람과 실망 그리고 자책의 연속으로 채워진 말들은 스스로 어긋남에 대한 혐오였을 것이다. 이런 생활 속을 탈출하듯 돌아온 고향. 그 고향이 건넨 위로는 아주 자그맣고 소소한 일들이었다. 자몽청을 만들면서 몽골 전통 음악인 흐미를 듣는 일, 동네 아이들과의 대화, 그리고 어머니의 미나리. 이런 과정에서 그녀는 온전한 자신을 찾아간다. 그 온전한 자신이란, 관계를 잇고 끊는 하나의 선으로 보지 않는 ‘나’와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을 신경 쓰지 않음을 깨달은 ‘나’. 이로써 주인공은 스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눈치 때문에 초조해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결정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온전함은 소설 마지막 부분인 석기의 등장으로 더 잘 보인다.
‘지금 막 화가 난 것은 아닐텐데....다른 것에 화가 나 있었는데 마침 그 화살이 나를 향했던 것일까 (중략)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혹여 진심이라 해도 그건 결국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마치 주인공의 예전 모습처럼 화가 나 있는 석기를 생각하는 주인공의 마음이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면 타인의 상처가 보이듯, 주인공은 그런 석기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와 마주치고 있다. 석기의 분노가 밖을 향하지만 결국 자신에서 오는 ‘어긋남’임을 그녀는 알고 있다. 어쩌면 주인공의 온전함으로 바라본 석기는 정말 가엾을지도 모른다. 그 누구보다 예전 자신의 모습이 괴로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석기처럼 화가 난 사람들이 많다. 왜 우리는 모두 이다지 화가 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루에 몇 번 흙을 밟고, 몇 번 새의 지저귐을 듣고, 몇 번 꽃의 시듦에 생각했던가? 그것은 곧 하루에 몇 번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았는가? 와 같은 질문이다. 소설은 지친 현대인에게 우리의 온전함을 얼마나 찾았는지, 우리의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묻게 한다. 그 분노는 다름 아닌 ‘여유, 삶, 도시의 어긋’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