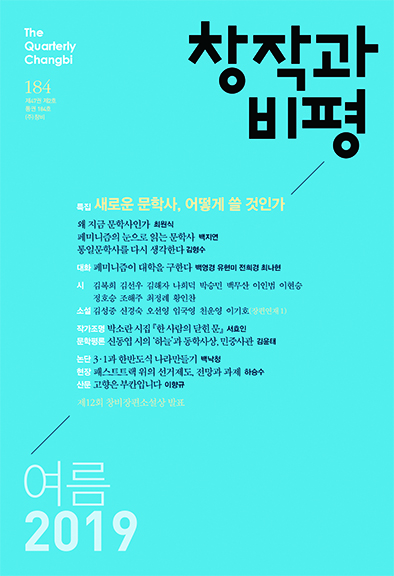
흔히 비즈니스 관계라 불리며, 맺고 끊기가 쉬운 관계 인 ‘아무들’ 속에서 자신마저 ‘아무’가 된 것 같은 비애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드러나는 고질적인 병이다. 그러면서 도 ‘혼자가 좋아’라고 말하는 자기 위로는 현대인에게 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떠안겨 주는 듯하다.
아무는 먹고
아무는 버리고
아무는 살해하고
아무는 외면하다
아주 배부른 채, 아주 한가롭게
김선 우 시인의 「아무의 제국」 中
무감한 오늘날 사회를 고발하듯 시인은 「아무의 제 국」 속에서 이인칭이 사라진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 다. ‘너’로 인식해 주지 않는 세계에서 ‘나’ 역시 그들을 ‘너’로 인식해 줄 이유가 없다. 점점 빠르게 퍼져가는 ‘아 무’의 세계 속에서 다같이 온기를 식히고, 어둡게 시간을 삼켜야만이 홀로 외롭지 않게 된다. 새로운 생존 방식이 다. ‘즐거움’, ‘외로움’, ‘분노’의 감정들마저 향해야 할 객 체가 사라진 세계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아니,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다. 마침내 감정이 없는 ‘아무들’은 아주 배 부르고 한가로운 그들만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렇지만 어느 몽상가가 계속 ‘아무’에게 존재의 의미 를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 뭔가 의미있고 가치있는 대상 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아직 그런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 것은 ‘제국’에 대한 쿠데타일지도 모른다. 김선우 시인은 강렬하게 ‘아무’를 아무렇게 보고싶지 않은 저항심이 있 었나 보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천문」에서는 마치 별 에 대한 서정으로 제국을 향한 반란의 횃불을 집어 든 것 같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나는 가끔
죽은지 오래인 별들의 임종게를 발굴해 옮겨 쓴다.
오늘 아침 닦아준 그림자에서 흘러나온 말
임종게가 늘 탄생게로 연결되는 건 아닐 테지만
가끔 유난히 아름다운 탄생의 문양들이 있어
우주가 지나치게 쓸쓸하진 않았다.
김선우 시인의 「천문」 中
서정시를 두 개의 혹을 짊어진 ‘낙타’와 같이 순응하는 무용(無用)의 시라고 비난하는 혹자가 있었다. 화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화해를 뿌리치고 ‘사자’가 되겠다는 혹자 는 얼마만큼의 포효로 ‘아무의 제국’을 쓰러뜨렸을까. 김 선우 시인의 정확한 포착처럼 ‘아무의 제국’이 돼버린 이 상, 혹자와 같은 판단으로는 시대가 주력하는 문학의 역 할을 할 수가 없다. 적어도 문학이라는 것이 병리적인 사 회에 병리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충격요법이 든 치유법이든 지친 현대인 곁에 다가가야 하는 것이라 면, 이제는 ‘아무’를 위한 서정시가 문학으로서의 역할로 대두돼야 한다는 것이다.
「천문」은「아무의 제국」과 달리 ‘아무’를 ‘너’로 보 았을 때의 가치를 얘기한다. 화자는 낙타도 아니며 사자 는 더욱 더 아닌, 단지 ‘당신’을 ‘별’로 바라보고 싶은 한 서정적 개인일 뿐이다. 하늘에서 발견한 의미있는 따뜻함 을 이인칭 ‘당신’에게 부여한 ‘나’는 그것 하나로 우주가 지나치게 쓸쓸하지 않게 된다.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 도, 그리고 아무리 억압적이더라도 ‘가끔 유난히 아름다 운 탄생의 문양들’이 있어 화자는 그들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
어쩌면 이 두 편의 시가 함께 실린 것은 독자에게 선 택권을 주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아무도 고통없는 ‘아무’의 삶과 쓸쓸하지만 지나 치게 쓸쓸하지 않게 해줄 ‘당신’이 있는 ‘별’의 삶. 나 는 기꺼이 ‘별’이 돼 쓸쓸하더라도 지나치게 쓸쓸하지 않을 삶을 ‘당신’과 살고 싶다.

